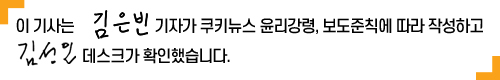최근 200조원이 넘는 글로벌 빅파마(대형 제약사)들의 투자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영향이다. 미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약사 로슈는 미국 내 제조·생산과 연구·개발(R&D) 기반 확충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미국에 500억 달러(한화 약 7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 현실화 되면 미국에서 1000개의 직접 고용을 포함해 약 1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도 일본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와 30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후지필름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세우고 있다. 리제네론은 후지필름과 손을 잡고 미국 내 자사 생산역량을 두 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앞서 존슨앤드존슨은 550억 달러(약 79조원)를 들여 미국에 3개의 생산시설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라이 릴리 270억 달러(약 39조원), 노바티스 230억 달러(약 33조원) 등 미국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계획이 이어졌다. 화이자도 관세 부과 시 해외 제조시설을 미국 내 운영 중인 13개 공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0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대거 미국으로 몰려드는 상황이다.
빅파마의 이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압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 머크(MSD), 화이자 등 미국 주요 제약사 CEO들을 비공개로 만나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의약품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 완제의약품을 수출하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GC녹십자, 대웅제약, 휴젤 등도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 의약품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면서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가격 부담이 높아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CDMO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기지를 인수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월 “작년부터 구체적 검토를 진행해 온 미국 현지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확보는 올해 상반기 중 투자 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미국 생산시설 인수를 위해 10개 정도를 들여다봤지만, 많은 공장들이 노후화해 위탁생산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해외 생산시설 매물을 계속해서 알아볼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바이오 생산 공장은 지금 당장 건설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4년 뒤에나 생산에 돌입할 수 있다. 공정 설비가 까다롭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쿠키뉴스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미국은 인건비가 높아 공장 건립에 따른 경제성이 맞지 않을 수 있어 빅파마들도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 경제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 “공장 건립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