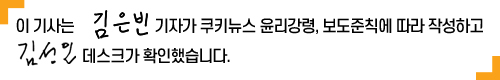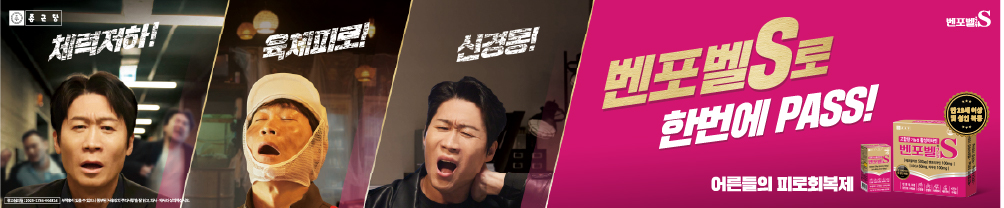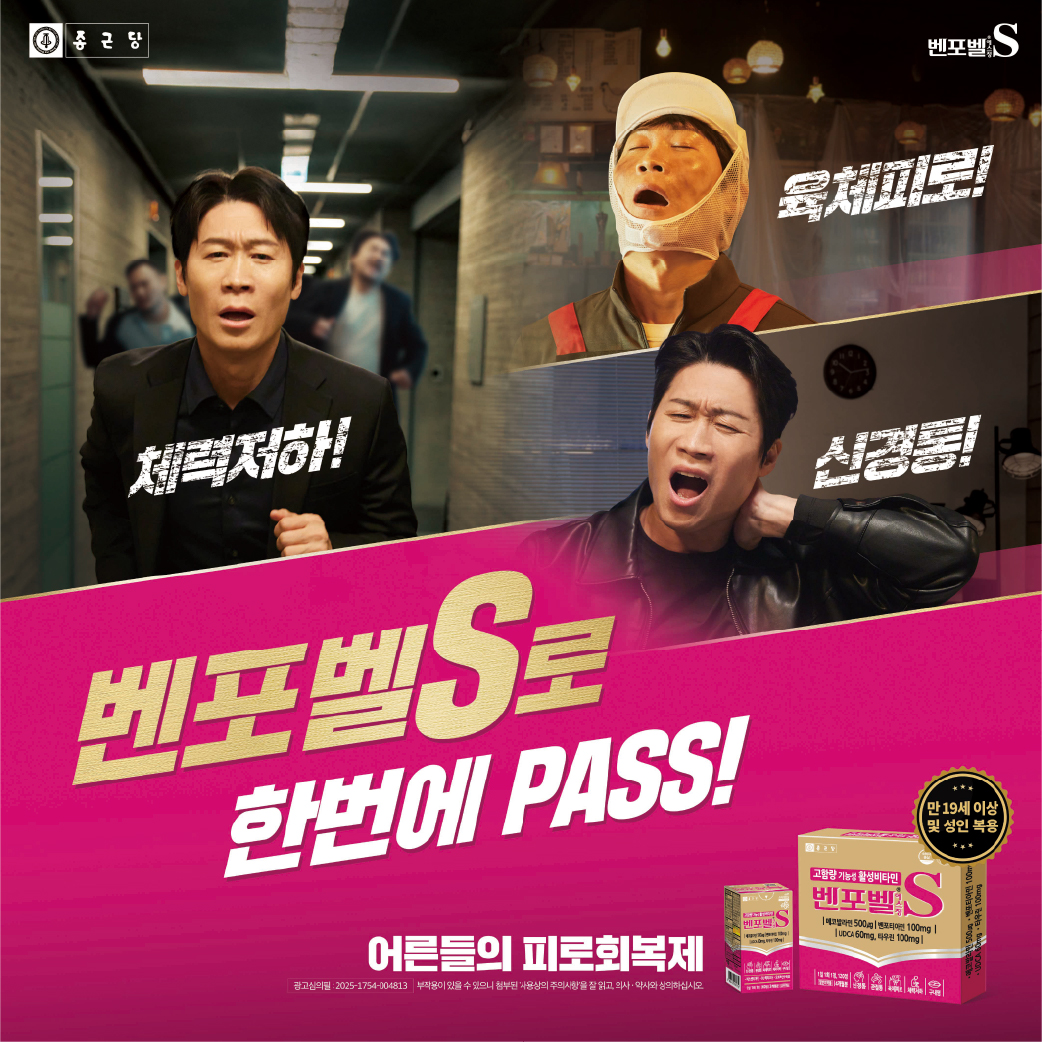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 납세 같은 사회 기여도가 작지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타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직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금 구조개혁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자격 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해 국가 기여도가 높은 국민과 그렇지 않은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해외 장기 체류자가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음에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수급 자격에 거주 기간 요건을 두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캐나다는 3년을 거주하며 생산, 소비, 납세 등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 기초연금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국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지급액을 차등화한 경우도 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거주 기간이 포함된다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 증가에도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필요한 복지 재정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여명에서 2023년 651만여명으로 늘었고, 소요 예산 역시 같은 기간 6조8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물음표도 따라붙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 이민자가 워낙 많다. 국적에 따라 모두 지급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거주 기간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고령층에서 해외장기체류자 등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재정 절감 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연금개혁 과정에서 이 제도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로 보인다. 생산적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논의”라고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