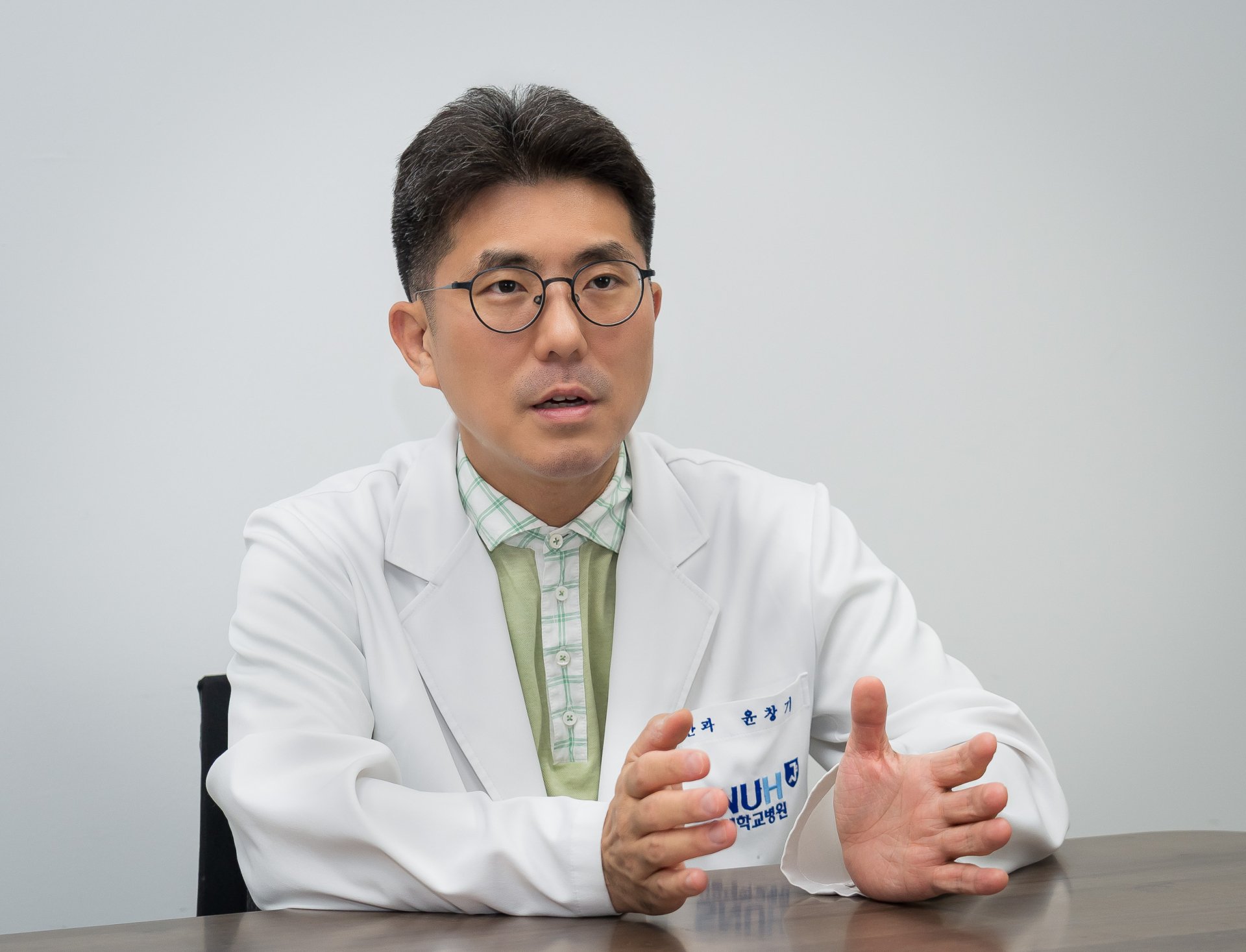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쿠키 사회] “굴곡의 삶을 사셨던 어머니는 파란만장한 한국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숱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사회의 기초 집단인 가족이 잘 버텼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40년 가까이 한국학을 연구해온 정구복(66)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어머니의 삶을 통해 한국사를 조명하는 ‘우리 어머님’(지식산업사)을 펴냈다. 위인이나 역사적 사건을 담은 전기와는 달리 평범한 어머니의 인생을 돌아봄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밟아간 시대의 경로를 가슴 뭉클하게 그렸다.
정 교수의 어머니 서순옥씨는 1909년 충남 공주군 우성면 여천리 여우내마을에서 태어났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합병되기 1년 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어머니는 한글을 배우지 못했다. 서순옥이라는 이름도 호적에만 오를 뿐 거의 불리지 않았다. 생일상을 차려 먹는 것은 꿈같은 얘기였다. 열 살 때 어머니를 잃은 뒤에는 집안의 모든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고 어린 두 동생을 보살펴야 했다. 세 살 아래 남동생은 중증장애인, 네 살 난 여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다. 그런 중에 1919년 3월1일 유관순 열사의 독립만세 소식을 들었다. 1925년, 열일곱의 나이에 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갓점마을에 사는 두 살 연하의 남편(정창식)에게 시집을 갔다. 시집에서는 친정 마을을 따라 ‘여우내댁’으로, 친정에서는 시집 마을을 따라 ‘갓점댁’으로 불렸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은 가난한 시집살이 속에서도 7남매를 낳아 키웠다. 힘들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던 어머니의 불행은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또다시 찾아왔다. 돈을 벌겠다며 떠돌던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고 모시 베를 짜서 팔아 돼지와 송아지를 사 키우며 자식들 공부를 시켰다. 이후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유신정권, 5·18민주화운동 등 급변하는 역사의 파도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는 호강 한 번 못해보고 2000년 12월24일, 9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힘겨운 우리네 어머니의 인생을 그리는 글 속에서 어머니는 어느덧 이 시대의 아픔과 동격이 되고, 비운의 역사가 된다.
정 교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됐다”면서 “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한 자락을 표하고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이들이 효도를 극진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40년 가까이 한국학을 연구해온 정구복(66)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어머니의 삶을 통해 한국사를 조명하는 ‘우리 어머님’(지식산업사)을 펴냈다. 위인이나 역사적 사건을 담은 전기와는 달리 평범한 어머니의 인생을 돌아봄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밟아간 시대의 경로를 가슴 뭉클하게 그렸다.
정 교수의 어머니 서순옥씨는 1909년 충남 공주군 우성면 여천리 여우내마을에서 태어났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합병되기 1년 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어머니는 한글을 배우지 못했다. 서순옥이라는 이름도 호적에만 오를 뿐 거의 불리지 않았다. 생일상을 차려 먹는 것은 꿈같은 얘기였다. 열 살 때 어머니를 잃은 뒤에는 집안의 모든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했고 어린 두 동생을 보살펴야 했다. 세 살 아래 남동생은 중증장애인, 네 살 난 여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다. 그런 중에 1919년 3월1일 유관순 열사의 독립만세 소식을 들었다. 1925년, 열일곱의 나이에 충남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갓점마을에 사는 두 살 연하의 남편(정창식)에게 시집을 갔다. 시집에서는 친정 마을을 따라 ‘여우내댁’으로, 친정에서는 시집 마을을 따라 ‘갓점댁’으로 불렸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은 가난한 시집살이 속에서도 7남매를 낳아 키웠다. 힘들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던 어머니의 불행은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또다시 찾아왔다. 돈을 벌겠다며 떠돌던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고 모시 베를 짜서 팔아 돼지와 송아지를 사 키우며 자식들 공부를 시켰다. 이후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유신정권, 5·18민주화운동 등 급변하는 역사의 파도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는 호강 한 번 못해보고 2000년 12월24일, 9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힘겨운 우리네 어머니의 인생을 그리는 글 속에서 어머니는 어느덧 이 시대의 아픔과 동격이 되고, 비운의 역사가 된다.
정 교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됐다”면서 “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한 자락을 표하고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이들이 효도를 극진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