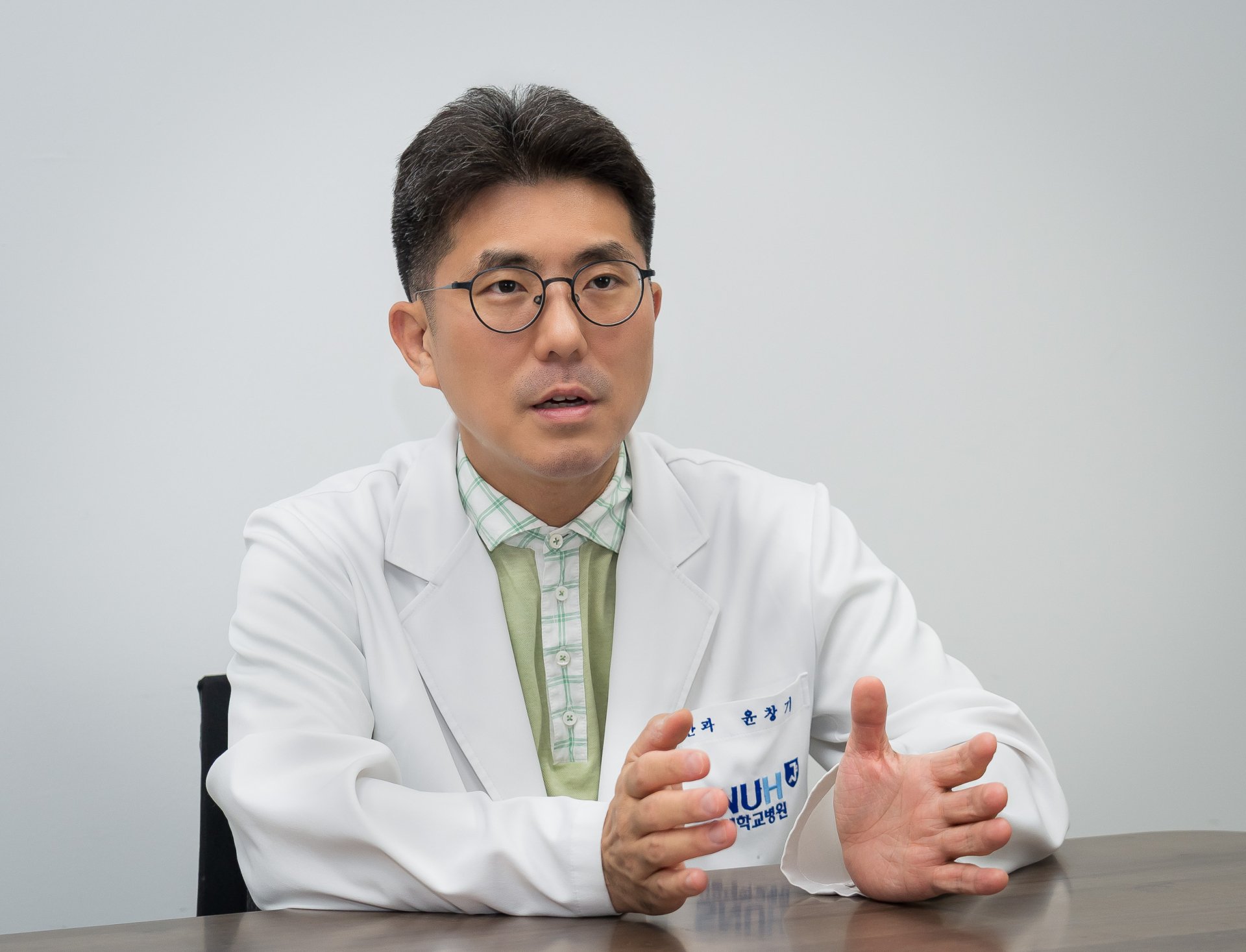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조용한 협상 카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 대부분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HBM의 약 80% 이상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다. 앞서 정부도 이번 협상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HBM은 AI 모델을 학습·추론하는 데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반도체다. 특히, 엔비디아의 H100, A100 등 AI 가속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지배적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2.5%, 삼성전자가 42.4%로, 양사가 94.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HBM뿐만 아니라 AI 메모리 전반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AI 메모리 시장에서 60%, D램에서 70%, 낸드플래시에서는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법(CHIPS Act) 등을 통해 자국 공급망을 키우려 하고 있지만, 이러한 높은 점유율을 토대로 HBM 분야에선 한국 대비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해 반도체 생산 시설에 1500억달러(약 206조원)와 연구개발에 500억달러(약 69조원)를 각각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점유율은 10% 안팎에 그쳤다. 다만 올해 2분기에는 삼성전자(17%)를 제치고 21%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 전체로는 여전히 약 80%를 점유하고 있지만, 추격 속도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이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추가 무역 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선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국이 반도체 중심의 외교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 관세 면제를 넘어 기술 협력, 공동 연구개발(R&D), 글로벌 투자 유치 등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의 HBM 기술력 유지가 필수”라며 “이 구조를 활용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