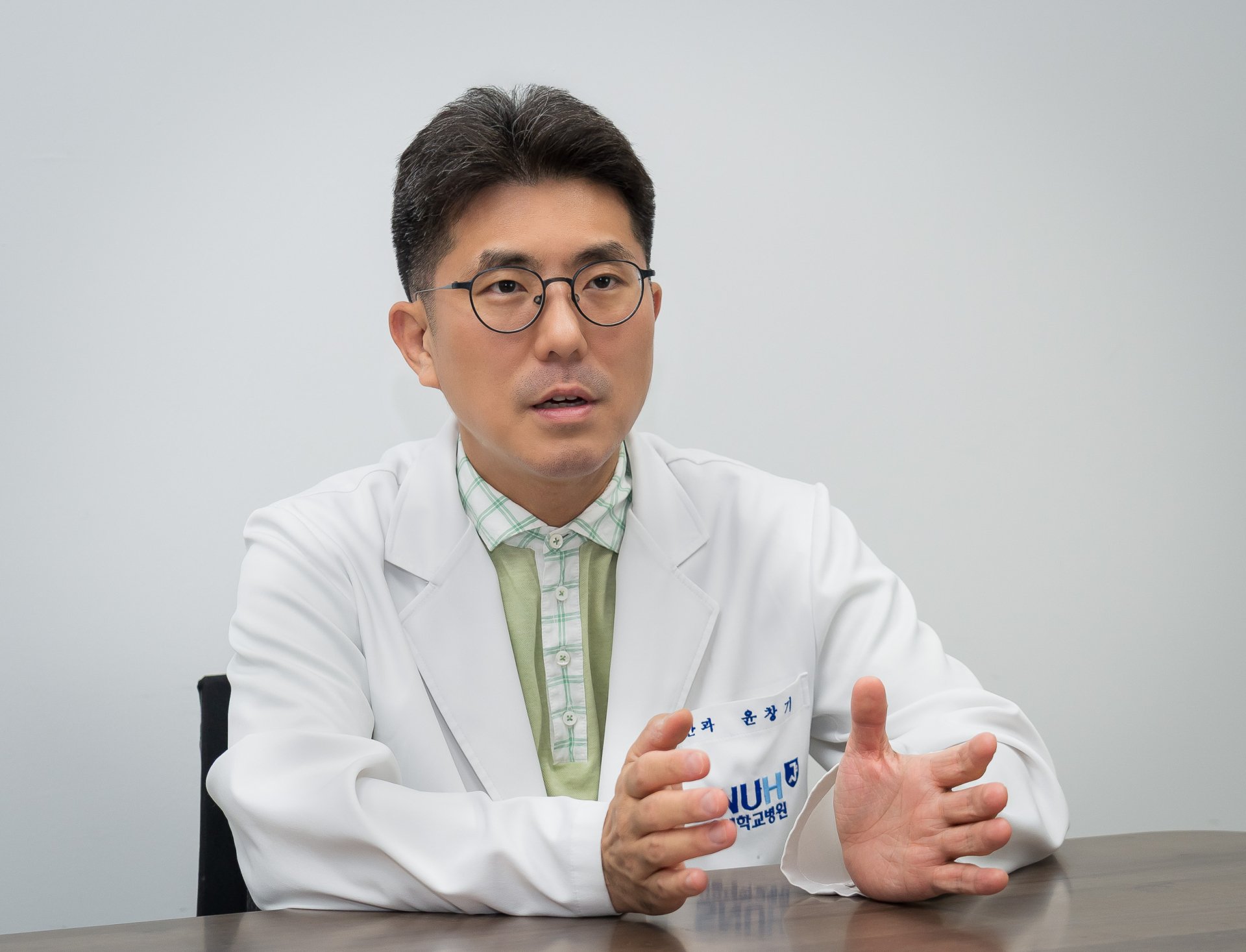그러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군인, 감염병 환자, 18세 미만·65세 이상 등 제한된 예외 상황에 한해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이 실제 비대면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해온 수요층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퇴근 후 병원을 가기 어려운 직장인, 아이 돌봄에 시간을 쓰는 보호자, 반복 진료에 피로를 느끼는 만성질환자 등 병원 진료가 녹록치 않은 사람들에게 비대면진료는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흐름은 명확하다.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있으며, 기술 기반의 진료 지원 시스템을 제도권 안에서 정비하고 있다. 한국은 사용자 수요와 기술 수준이 모두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에선 가장 뒤처진 상태다.
현장은 이미 제도보다 훨씬 앞서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단순한 화상 연결을 넘어 진료 전·중·후 전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고도화돼 왔다. 진료 전에는 자가 문진과 건강·복약 이력을 자동 정리해 의사에게 전달하고, 진료 중에는 증상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조화하며, 진료 후에는 복약 안내, 건강 루틴 제공, 예후 모니터링까지 지원한다. 이는 진료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실질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미 현장에서 그 효과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이 제도 밖에 놓인다면 국가 차원에서 정밀의료를 위해 추진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역시 동력을 잃게 된다. 이 사업은 진단 기록, 투약 이력, 건강검진 정보 등 환자 단위 데이터를 연계해 정밀의료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플랫폼이 환자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주요 접점임에도 법적으로 배제한다면 데이터 흐름은 단절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생태계는 형식적 구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비대면진료는 의료를 대체하지 않는다. 의료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지금의 법안은 기술 발전과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단순 중개 여부가 아니라, 기능과 기여를 기준으로 플랫폼의 제도적 지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현실과 일치하는 정합적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