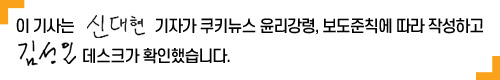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6일 ‘환자샤우팅카페’ 행사를 열고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며 매년 간병비로 3880만원을 쓰고 있는 손모(64)씨의 사연을 전했다. 손씨는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세미 코마’(혼수상태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아들을 18년째 돌보고 있다. 2007년 하루 6만원 수준이었던 간병비는 올해 15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식비를 포함해 간병비로만 매달 500만원가량이 지출된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내년엔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고비가 동시에 찾아올 전망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간병비는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다. 월급은 300만원인데 간병비로 400만원이 나간다고 호소하는 가족도 있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조사에선 하루 평균 간병비가 2019년 7~9만원에서 2023년 12~15만원으로 늘어 월평균 380~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 때문에 가계가 거덜 나고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 케어’가 고착화되면서 간병인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심해진다. 급기야 간병에 지친 가족이 돌보던 가족을 숨지게 하는 ‘간병살인’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간병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한 해 평균 5.6건에 그쳤지만, 2020년대 들어선 18.8건으로 급증했다.
돌봄 부담이 고용 중단, 가계 파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엮이며 정치권의 관심도 크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가족 간병 시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에겐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제시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건강보험 등 공적 재정을 통해 일부 간병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연간 최소 3조6000억원에서 최대 15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건보 재정에서 연간 1조2000억원, 최대 1조6000억원 수준이면 요양병원 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국가 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건 매한가지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 인상 △일부 항목 급여 축소 및 재조정 △간병보험 신설 △국고 보조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는 국민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와 대선 후보들 모두 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지만,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진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간병 부담에 따른 논란이 거듭되는 사이 일본은 2000년에 공적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국민 간병서비스의 대부분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대만은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 간병인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간병은 가족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담을 짊어진 가족들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에 갇혀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간병파산’, ‘간병지옥’, ‘간병자살’, ‘간병살인’이라는 극단적 단어가 언론에 왜 자주 등장하는지 그 이유를 헤아리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들이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돌봄의 구조는 국가가 설계하는 ‘복지’란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